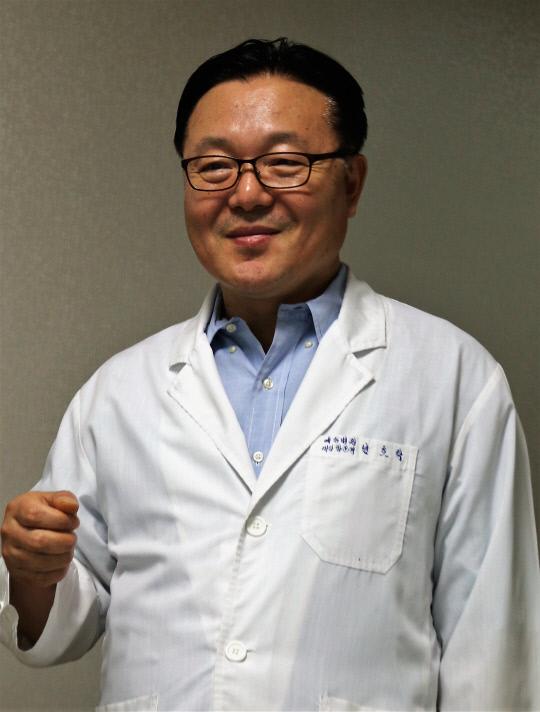
글이라는 정체불명의 늪에 빠져 맺어진 인연이니만큼 초장부터 이야기는 자연스레 그쪽으로 물꼬를 텄다. 수필이 어떻고, 시는 이래야 하고, 소설가 아무개는 어땠고. 그러기를 어디쯤 선생님의 입에서 `취해서 50년`이란 수필집 읽어봤나?,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얼마나 줄기차게 마셔댔으면 책 제목까지 그렇게. 술을 잘 드셨나 봅니다. 잘 마셨지. 누가 곤경에 처했거나 아무개에게 축하해줄 일이 생기면 어디가 되었든 찾아가 술을 사줬지. 수필 좀 쓴다는 사람치고 그 양반한테 술 한잔 얻어먹지 못한 사람이 없다니까. 언젠가 내가 시답잖은 선거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나를 부르더라고. 술을 한잔 사주면서 돈 봉투를 내밀고는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얻어먹지 말라는 거야. 그땐 그 양반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는데, 그런 내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겠나? 돈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 양반 젊을 때 엄청 고생했어. 한데 우연히 시작한 사업이 대박 나는 바람에 제법 돈을 모았지.
요즘 잘나가는 기업 중에 그 양반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있어. 자그마치 네 번이나 부도가 났는데 그때마다 그 양반이 찾아가서는 돈을 건네며 다시 일어서보라고 했다는 거야. 넘어질 때마다 찾아가 손을 내미는데 일어서지 못할 놈이 어디에 있겠나? 안됐다 싶으면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양반이었어. 한데 어쩌자고 운명이란 놈은 그런 양반에게 암이란 족쇄를 채워 부랴부랴 끌고 간 것인지.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막걸리 한 대접을 단숨에 들이켰다. 술을 얻어 마시는 건 고사하고 그분의 얼굴조차 뵌 적 없는 나 역시 착잡하고 비통한 마음에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다. 선생님, 요즘도 수묵화를 그리십니까? 가라앉은 분위기를 깰 겸 건넨 말이었다. 명주바람을 그려보려고 준비 중이야. 명주바람이요? 명주실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나라도 그려서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아닌가.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났으니까 내 나이도 적은 게 아냐. 마칠 수 있을지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어디쯤에서 술자리를 접은 우리는 각자 집으로 향했다. 시를 쓰는 심약한 형은 서양화를 그리는 누님의 차에 올라탔고 나는 선생님과 함께 걸어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자네 타는 거 보고 갈게. 한사코 먼저 가시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선생님은 막무가내였다. 나를 태운 고속버스가 저만치 멀어지기까지 손을 흔들어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에 아스라하다. 웃고 계셨는지 찡그리고 계셨는지, 거기까진 기억에 없다. 하지만 작별할 때 지그시 나를 바라보던 선생님의 그 눈빛만큼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날고기처럼 선명하게. 그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 눈빛은 나를 쏘아보며 이렇듯 소리를 질러댄다. "자넨, 뭐에 취해 사나?" 남호탁 수필가·예일병원 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