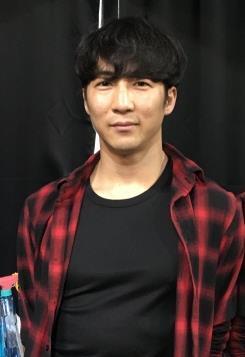
한참을 추고 나서 숨이 턱에 찰 때쯤 할머니 한 분이 신이 난다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나도 덩달아 신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반대쪽 어르신 한 분이 눈물을 흘리셨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시선은 줄 곧 내 춤을 보고 계셨다. "너무 잘 한다", "재미있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이내 몇몇 분들의 눈물이 보였다. 바이러스에 전염되듯 흘리는 어르신들의 눈물이 괜스레 부끄러웠다. 나는 잘 추지 못했다. 내 춤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날 나의 춤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많은 것들을 담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건물 밖을 나서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야 많은 생각들이 쏟아졌다. 그 분들의 눈물, 내가 춤을 멋들어지게 춰서 감동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음악에 몸을 흔들며 몸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큰 위로였던 것이다. 춤을 더 잘 추고 혹은 멋있는 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찾아와 바라보며 땀을 흘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현실 자체가 이미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제야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르신들이 해준 말씀이 떠올랐다.
공연을 마치고 늘 듣던 관례적인 인사치레 말들 "잘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멋있어요.", "감동적이 었어요"가 아닌 "고맙습니다"라고 하셨다. "고맙습니다." 이 한 마디에 한참동안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고마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나온 것이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 힘을 얻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다시 한 번 생긴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언제인가요? 서윤신 FCD댄스컴퍼니 대표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