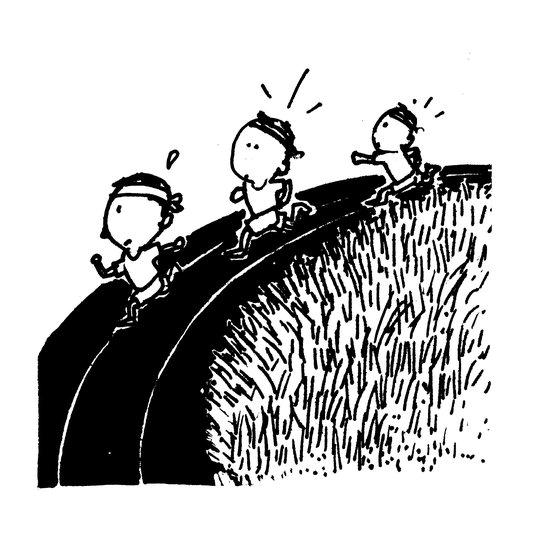
맨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탄성을 제공하지만, 색깔을 내는 안료와 경화제 등 화학첨가제 등이 숱하게 들어간 우레탄 트랙에 대한 국가기준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세워진 때는 2011년 4월 19일이다. 1년 반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2년 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 기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시공된 우레탄 트랙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검출 된다. 그리고 시공한 지 오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은 열화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분부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부스러기가 생겨난다. 작은 부스러기는 공기중에 떠돈다. 운동장과 트랙에서 운동하고 뛰노는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 그런데 당장 걷어내자니 철거비용부터가 문제다. 이래서 우레탄 트랙은 애물단지가 됐다.
우레탄 트랙을 둘러싼 문제처리 과정을 보면 `기본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다시 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많은 학교에 시공을 했는데도 국가기준이 뒤늦게 만들어졌고, 그 국가기준도 자체연구보다는 선진국의 기준을 들여와 많이 참고한 흔적이 짙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얼마나, 어떻게 유해한지 과학적 연구를 거친 보고서도, 임상시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레탄 트랙의 성분이 유해하다는 지적은 오래전 있었지만 그런 지적에 귀기울이는 이도 거의 없었다.
악화된 여론이 예상과 달리 매우 커지니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는데 그럴 만한, 뒷받침할 만한 `기반`이 전혀 안돼 있는 것이다. 기본이 충실한 사회는 언제 될지 답답하다. 류용규 취재2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