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각의 지배 존 앨런 지음·윤태경 옮김 미디어윌·312쪽·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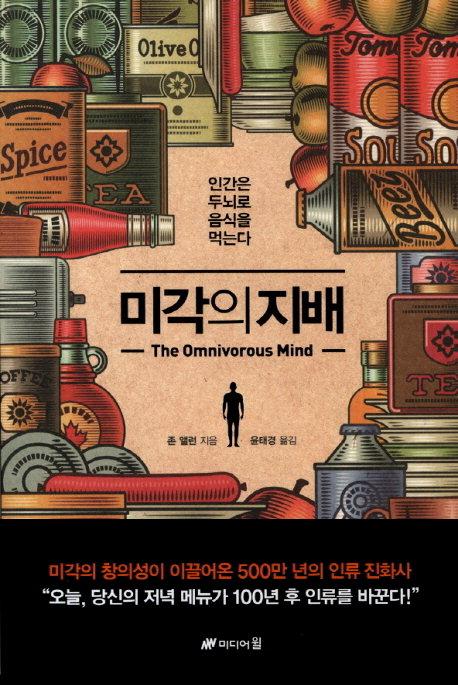
이처럼 식생활에는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때로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신경문화인류학자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인간의 식이행동을 연구해왔다. 인간이 초잡식 동물이 된 이유가 뭔지, 매운 맛이 고통인지 쾌락인지, 체중·음식·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는 왜 대부분 남자인지 등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식생활이 인류의 진화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인지심리학, 현대생물학, 뇌과학, 문화인류학, 영양학을 씨줄과 날줄 삼아 먹는 것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저자는 식이행동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한다. 바삭한(crispy) 음식이 사랑받는 이유도 이와 관련 있다. 감자튀김, 과자, 튀김, 프라이드 치킨 등 바삭한 음식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인기가 있다. 유해성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튀긴 음식이 혀를 즐겁게 해주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왜 튀긴 음식은 인기가 좋을까. 저자는 그 연원을 인류의 조상이 외골격에 싸여 바삭거리는(?) 곤충과 아삭아삭한 채소를 먹은 데서 찾는다. 또 불을 사용한 조리기술을 익힌 후 고열로 음식을 익힐 때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식품이 가열될 때 환원당과 아미노 화합물이 일으키는 반응)'을 알게 된 덕분에 바삭한 음식을 즐기게 됐다고 본다.
현대 음식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비만의 세계적 유행'을 들고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전례 없이 풍요로운 음식 환경 속에서 많은 양의 칼로리 소비가 될 만큼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고착화된 현대인의 몸엔 점차 지방이 쌓여간다. 저자는 "전통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고지방 음식과 달콤한 음식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먹어둘 수 있을 때 먹으려는 성향이 진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전통사회에 맞춰 진화한 인체가 음식이 풍부한 반면 칼로리 소비 활동은 현저히 줄어든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이어트와 관련한 현대적 이슈를 소개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지방형태의 에너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리는 호르몬'인 렙틴을 비만인 사람에게 투여하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렙틴에는 저항성이 있어 이미 비만인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렙틴을 다른 물질과 함께 사용했을 때 체중감량효과가 뛰어났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 사례를 들며 사람마다 음식을 인지하는 방식, 식이행동 통제 양식이 달라 앞으로는 보편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 다이어트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 말한다.
저자는 이에 더해 "식이 행동과 관련된 사회 환경과 심리가 바뀌면서 체중감량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인간의 신체와 두뇌는 음식이 있을 때 많이 먹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며 과식행위를 비도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책은 잡식, 조리, 경험, 금기, 비축 등 식생활 속의 다양한 행동을 분석하며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를 통해 혀가 인류의 진화와 역사를 이끌어왔음을 보여준다.
매일 세끼를 반복적으로 먹는 우리는 먹는 것이 주는 행복과 쾌락에 무신경해졌다. 그리고 바빠지는 일상에서 식사는 문화의 의미가 탈색된 채 하루를 버티기 위해 '때우는 것'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귀로 음악을 듣고 눈으로 미술작품을 보며 감동을 느낀다. 혀에서 시작해 두뇌로 전해지는 맛의 황홀경이나 음식이 이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의 감동이라는 것을 너무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최정 기자 journalcj@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