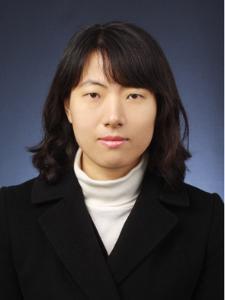
오래되고 낡아서 윤이 날 듯 말 듯 묵은 냄새 풍기는 이 물건들은 "우리 대고모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어 있는 것"이기에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추억이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그 물건들은 우리 집 공간을 이미 돌아가신 가족의 온갖 기억으로 빼곡히 채우며 그들의 존재를 환기하기에 고장이 나고 부서져도 버릴 수 없다.
물건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가지며 소비자인 인간의 기억을 간직한다. 미야베 미유키의 `나는 지갑이다`라는 소설에서처럼 하나의 물건은 그 소유자의 신분과 가치관, 경험과 개성 같은 것을 투영한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소비하는 물건들의 이야기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앞에는 연결된 두 대의 모니터가 방향 지시등처럼 깜박이며 빨리 글을 이어가기를 재촉하고 있고, 키보드 오른쪽으로는 커피와 대추차가 담긴 두 개의 텀블러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커피가 담긴 도자기 텀블러는 20년 전에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언니에게서 선물 받은 것으로 하얀 표면에 `I am not a paper cup`이란 문구가 씌어 있다. 그 문구는 만화책 수집과 글쓰기, 예쁜 물건 나누기와 수다 떨기를 좋아했던 언니에 대한 기억으로 잠시 나를 이끈다. 이처럼 나의 일상은 내가 가진, 내가 소비하는 물건들로 채워지며 물건들은 저마다 나의 시간을 기억으로 간직하며 조금씩 낡아간다.
우리의 일상을 채운 물건들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보존하며 소비하는 사람들을 인류학자 그랜트 매크래켄은 큐레이터적 소비자라고 부른다. 큐레이터적 소비란 개인이 자신의 소유품을 기억가치를 지닌 것으로 취급하면서 물건들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존하고 전시, 양도하는 소비 패턴을 말한다. 큐레이터적 소비자에게 물건이란 간단히 쓰고 낡으면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강한 기억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끊임없이 길들이며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하나의 영혼이다.
이런 소비패턴은 대량생산되고 유통되는 공산품과 일회용품들로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 행위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꼭대기까지 채우고 있는 엄청난 공산품과 일회용품의 존재는, 물건을 쓰는 행위를 일상의 기억을 간직하는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로 만들고 있다. 소비가 탕진이 되는 시대, 우리의 일상을 채운 물건들이란 세대를 이어온 기억의 저장고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을 이사철에,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컵 같은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난 데다 명절을 지나며 선물 포장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올 가을 각종 쓰레기 처리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물건들의 세계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얼마나 더 누려야 할까? 물건을 쓰레기로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큐레이터적 소비자의 형상은 일정한 깨우침을 준다. 물건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 물건들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으며 버려지기 위해 태어나는 사물은 없어야 한다는 것. 물건의 소비가 기억을 간직하고 향유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주리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