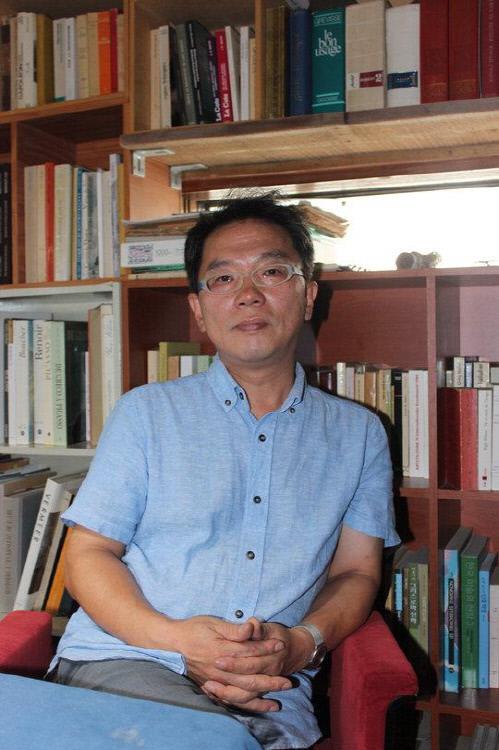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백 년에 걸친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전통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침묵을 강요해 왔고, 해방 후 군사독재정권하에서의 인권유린의 폐해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감내하고 있는 갈등의 근저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후 공정한 사회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미투 운동"이나 정·재계의 갑질 고발,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출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하고 당연한 변화에 국민 각 계층의 합리적이고 수렴된 의견보다는 제도적, 사법적 우격다짐이 우선되고, 인터넷 고발을 앞세운 여론재판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고, 그리고 진보, 보수에서도 그 양 극단의 시끄럽고 우스꽝스런 모습만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양 치장돼 온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민심을 분열하는 고발만이 난무하고, 그 바탕에는 고삐 풀린 고발문화가 공정과 평등의 상징인양 숭앙되고 있다. 공정이란 미명아래 대의정치의 기본은 사라지고 선정적인 포퓰리즘 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도나도 박수칠 수밖에 없는 "평등과 공정"이란 아주 편리한 개념에, 그 권리를 수혜 함에는 일정한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의 끝은 요원해 보인다.
다른 채널들을 눌러본다. 명절이라선지 많은 영화들이 소개되는 데 마침 가족 간 명절화투놀이의 위험성에 대해 심사숙고했던 차라, 도박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 영화에 눈길이 간다. 우리 국민 수백만이 봤다는 이 영화의 공통언어는, 한마디로 "욕"이다. 도박은 핑계고 어쩌면 욕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게 이 영화의 숨겨진 의도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대본작가는 앞서 거론한 "혼잣말 모욕죄"에 조심해야 할 듯하다. "미투 운동"에 관해서도 오늘 TV시청이 영감을 준다. 법에 따르면 이제 구식의 연애는 존재치 않을 것 같고, 이성간의 모든 암시와 은유도 자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될 듯싶지만, 구호단체 모금선전과 3살 이하 대상의 만화영화 외에는, 화면에 비치는 모든 게 성적인 코드로 버무려진 듯한 느낌은 나만의 것일까? 우리 사회의 위선에 대해 생각해 본 명절 오후이다.
전창곤 대전프랑스문화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