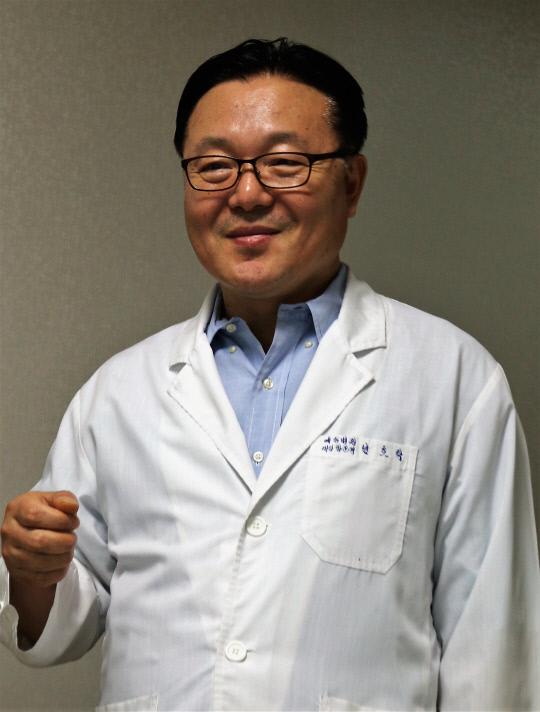
그렇듯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내가 못마땅하기라도 하다는 듯 불쑥 내 앞 타석으로 건장한 사내가 끼어 들었다. 울뚝불뚝한 근육질 상체며 반바지 밖으로 노출된 튼실한 허벅지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몇 차례 가볍게 몸을 흔들며 준비운동을 하는가 싶던 젊은 사내는 타석에 들어서기 무섭게 채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근육질 몸매며 커다란 덩치로 보건대 사내가 채를 휘두르기도 전에 허공을 가라며 시원스레 날아갈 공의 궤적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한데 웬걸, 사내가 후려갈긴 공이 그리는 궤적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오줌발처럼 가냘프고 답답하기만 했다. 바닥을 기는 공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공이 떴다 싶으면 얼마쯤 나아가다가는 이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일쑤였다. 딱! 철퍼덕! 딱! 에계! 사내의 우격다짐에 애꿎은 공만 으스러지지 싶었다. 알 수 없다는 듯,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내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사내의 예사롭지 않은 몸놀림을 지켜보던 나 역시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 사내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모자라지는 않지 싶다. 폭소를 터뜨리지 않고 용케 견뎌낸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대견할 지경. 다른 건 몰라도 집념 하나만큼은 대단한 사내임이 분명했다. 공이 바닥을 기든 말든, 비실비실 날아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채를 휘두르고 또 휘둘러댔으니까. 멀리 보내고 싶어 안달인 사내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공이 벌이는 사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내의 허벅지며 목덜미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티셔츠는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용을 쓰는 사내도 사내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골프채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이버 편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기실 드라이버는 애초부터 공을 멀리 내보낼 목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골프채가 아닌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드라이버를 휘둘러 공을 멀리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공을 멀리 날려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었다. 사내는 땀을 뒤집어쓴 채 쉼 없이 채를 휘두르고 또 휘둘러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사내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미끈한 몸매의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건만…. 자신의 근육질 팔뚝만 의지할 뿐 드라이버에 굴복할 줄 모르는 사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도 좀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사내. 철퍼덕대고 또 철퍼덕거리면서도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드라이버의 생김새나 설계된 목적에는 눈길 한 번 줄 줄 모르는 사내.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지금, 문득 사내가 오래도록 곁에서 보아왔던 사람처럼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남호탁 수필가·예일병원 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