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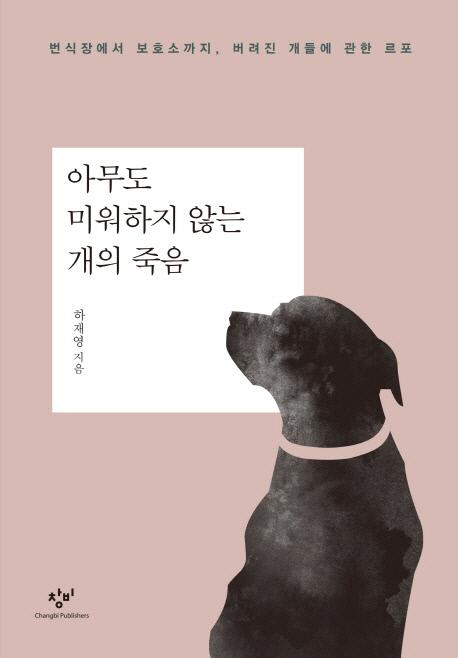
이 새끼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애견 번식장에서 태어난다. 번식장의 개들은 켜켜이 쌓인 배설물 위의 케이지에서 일생을 보내며 기계처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
근친교배로 크기를 줄인 강아지들은 온갖 유전병과 열성인자를 떠안고 어미젖을 채 떼기도 전에 경매장에 나와 소매점으로 팔려간다. 애견숍이나 마트에서 쉽게 개를 산 사람들은 개가 번거로워지거나 크기가 커져 더 이상 귀엽지 않으면 역시 쉽게 개를 버린다.
버려진 개들은 아주 적은 수만이 지자체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찾고, 대부분은 안락사된다. 보호소에조차 가지 못한 개들은 육견업자의 손에 들어가 개고기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다.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진다. 작가는 `개 산업`의 다각적 취재를 통해 한국의 유기견 문제가 개식용과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폭로한다.
유기견 양산의 근원은 수요를 훌쩍 넘기는 공급을 쏟아내는 불법 번식장이고, 이 기형적인 생산구조가 유지되고 넘치는 공급이 `해소`될 수 있는 이유는 `반려견`들이 언제든 식용견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기견 문제는 개식용을 논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개식용은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다. `소는 먹어도 되는데 개는 왜 안 되느냐`는 반박, `개식용은 한국 고유의 문화다`라는 주장 등, 개식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반감을 사기 쉬운 일이다.
이 책은 개식용 문제를 동물권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개식용 합법화가 실은 모두의 손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한다.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개에서 시작하는 이유를 작가는 한국사회에서 개가 차지하는 특별하고도 분열된 지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개가 반려동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곳에서는 개의 동물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장 나은 처지인 반려동물이자 최악의 처지일 수밖에 없는 식용동물이다. 동종의 동물을 가족이자 음식으로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연민을 확장할 수 있을지 살펴봄으로써, 이 이야기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과 가장 먼 동물 사이의 가교가 되길 바랐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 책은 발로 뛴 인터뷰와 취재에 기반해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르포로서도 가치 있지만, 국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잘 쓰인 논픽션으로서도 단연 손꼽을 만하다.
소설 쓰기로 단련된 필력으로 완성한 탄탄하고 입체적인 구성, 오랜 고민을 통해 도달한 깊은 사유와 윤리적 고찰은 읽는 이에게 한층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동물에 아무 관심도 없던 작가가 반려견과의 관계를 통해 동물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고, 반려견에서 유기견, 모든 개, 그리고 모든 동물로 인식의 지평과 연민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읽는 이의 인식 범주도 자연히 함께 넓혀진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