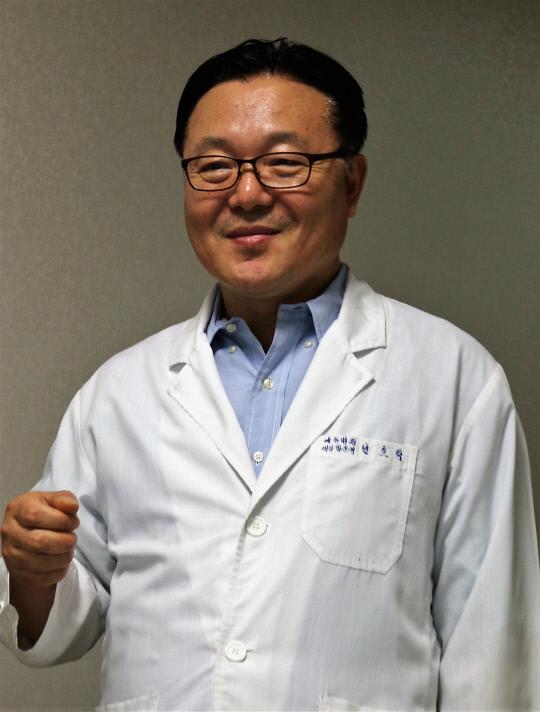
"어디쯤 오고 계세요?"
문제가 생겼단다. 미안하게 되었다며 다른 차를 불러보라고 한다. 오들오들 떨며 아파트 입구에서 지금껏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나 역시 물러서지 않는다. 타고 안 타고를 떠나 사정은 알아야겠다. 그러자 5분 정도 더 기다려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쭈뼛 대며 내 고막으로 기어든다. 기다릴밖에. 얼마 후 기다리던 택시가 내 앞에 멈춰 서고 나를 태우기에 앞서 젊은 여자 손님을 게워낸다.
"죄송합니다, 손님. 문제가 생겨 늦었습니다." "빨리 해결하셨네요." "택시요금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지 뭡니까."
홀라당 다른 손님을 태우고는 차에 문제가 생겨 갈 수 없다며 뻔뻔스레 둘러대고 있겠거니 넘겨짚고 있었는데. 차도 왔고 의심도 풀렸고 몸도 따뜻하고, 그런대로 좋은 아침이다.
`그나저나 수수료가 천원이라니…….`
운전하는 내내 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시렁댄다. 그러고 보니 늙수그레한 기사의 손에 영수증 쪼가리가 들려져 있다. 뭐냐고 물으니 이렇단다. 단말기 고장으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 손님이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으로 가자고 하고는 현금을 인출했단다. 그리고 수수료 천원을 떼고 택시요금을 계산했단다. 기사에 손에 들려져 있는 종이쪼가리는 수수료 천원을 증명하는 영수증 바로 그것.
"손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 거야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그러네요."
내가 들어봐도 손님의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단말기 고장이 기사 탓도 아니질 않은가. 창문을 연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한기가 몰려든다.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얼굴은 한결 처량해 보이는 것이고. 그 말을 끝으로 기사는 더 이상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차를 몰 뿐. 나 역시 좌석 등받이에 몸을 묻고는 자투리 잠이라도 취할 양 눈을 감는다.
"메-밀 무-욱! 차-압-쌀 떠-억!" 꿈결인가 환청인가, 느닷없이 유년의 낯익은 목소리가 가슴 밑바닥에서 꼼지락대며 몸을 일으킨다. 얼굴에 살짝 미소가 인다. 찹쌀떡을 파는 그 남자는 밤새 그렇듯 떠들며 내 유년의 동네를 배회했다. 커다란 목소리가 작다 여겼음인지 가뜩이나 낮은 창문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기도 하면서.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뭐라고 할까? "설마." "말도 안 돼." "그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말이 되 든 안 되든 내 유년의 그 누구도 정당한 요구 운운하며 찹쌀떡 장사에게 눈을 흘기거나 그를 고발한 이가 없다는 것만큼은 자명하다.
겨울이 다가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찹쌀떡 장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상대방의 처지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정당한 요구`라, 글쎄? 얼음처럼 차가운 권리 앞에 `정당한`이란 수식어를 부여해도 되는 것일까? 문득 생각에 잠긴다.
택시에서 내리자 한층 더 매서운 한기가 나를 맞는다. 춥다. 택시를 타기 전보다 더 춥다. 여기도 꽁꽁 저기도 꽁꽁, `엘사`의 마법에 걸려 얼음 속에 잠긴 `겨울왕국`이 따로 없다. 잔뜩 몸을 움츠린 채 발걸음을 옮겨놓는 머릿속이 착잡하다. `마법을 풀어줄 `안나`는 어디쯤 오고 있는 것일까?` 남호탁 수필가·예일병원 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