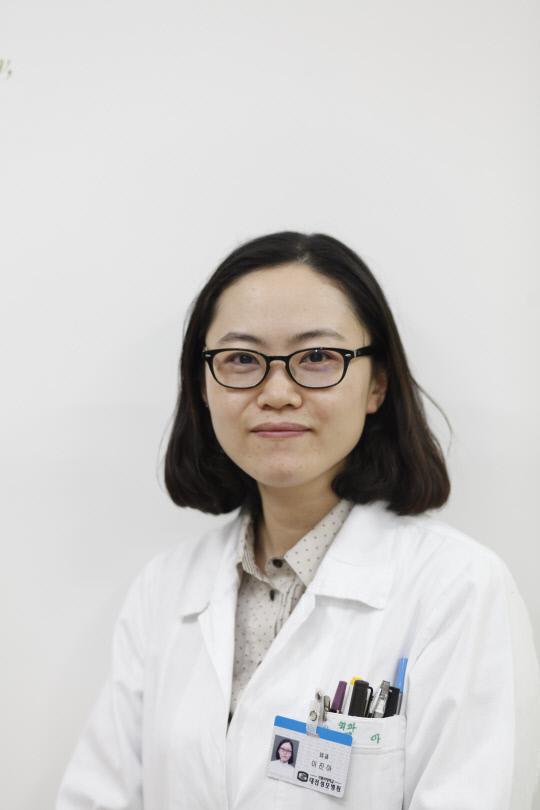
큰 수술에 의한 후유증으로 문합부에는 유출이 심했고 환자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2주가 넘게 사투를 벌였다. 이후 문합부 유출은 전신 패혈증으로 이어졌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모든 의료진이 환자 옆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환자는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산소 공급기에서 나오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환자는 강한 의지로 버텨냈고, 병원 생활 2개월 만에 퇴원해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입원해 생사를 넘나들었기에 환자의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며 내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후 그 환자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통원치료를 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차츰 좋아지는 듯 싶더니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종양이 재발했다. 환자는 다시 복통과 종양에 의한 장폐색 증상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게 됐다. 식사도 하기 어려워져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게 됐고, 그나마 몇 번 했던 항암 치료도 더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환자의 70대 어머니와 친해지게 됐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의 침상 곁에서 아들을 지키며 병수발을 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거뒀다. 가끔 문병 올 때 만난 남매는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마음을 아리게 했다. 어느새 투병 기간은 2년이 넘어갔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지칠 만도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듬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환자는 방법이 없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을 도우며 의연하게 투병생활을 이어가는 환자의 모습은 의료진 및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손수 짠 큼지막한 숄이 들어있었다. 아들이 건강해지길, 이 선물을 받는 내가 아들을 낫게 하길 기원하면서 한 땀 한 땀 숄을 짰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듯 아파졌다. 어머니의 바람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투병생활 2년 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복강 내 암 전이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다. 찬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지금도 3월이 되면 가끔 아들을 생각하는 노모와 죽음 앞에 의연하던 그 환자가 생각난다. 그리고 의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된다. 이진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