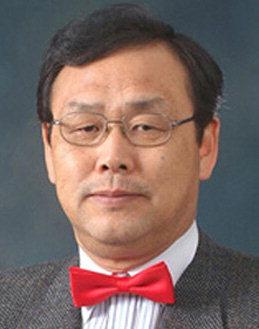모처럼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무엇보다도 광고물이 눈에 띄는 모양이다. 특히, 관이나 단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걸어 놓은 현수막을 보고서 물어온다. 거기다 특이한 것은 오토바이 타고 건물 앞을 지나면서 명함광고물을 던지는 것이다.
오클랜드에서 집 앞 우체통에 광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No Junk Mail`이라는 표시를 붙여 놓았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단 한 장의 광고물도 들어오지 않아, 일주일 지난 후에 표시를 떼었더니 그제야 전단이 들어왔다고 한다. 전단뿌리는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넣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100만t 이상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소각하는데 이를 2015년까지 `Zero Waste`로 만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 조례를 만들어 `확실히 넣지 말라`고 표기를 해놓은 우체통이나 주차된 자동차 유리창에는 광고전단을 꽂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다만 자선단체, 정당 그리고 신문은 예외로 하고. 자기 연락처가 있는 광고물을 원치 않는 곳에 넣는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이는 불법광고물 유포 협의에다 무단주거 침입까지 함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 법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에다 무거운 벌금 때문에 절대 넣지 않는다 한다.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헌법을 고치기 전에 `서있으면 주차위반, 달리면 속도위반`인 민원관련 법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 한다.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적용 되냐고 억울해 하고,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준법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확실한 시스템이 작동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한 듯 싶다. 결단코 법을 어긴 사람은 우쭐되거나 용감하지 않고, 지킨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
유병우 씨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