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아프리카 노예무역 일반·종교인 모두 당연시 여겨 역사는 현재의 진실된 기록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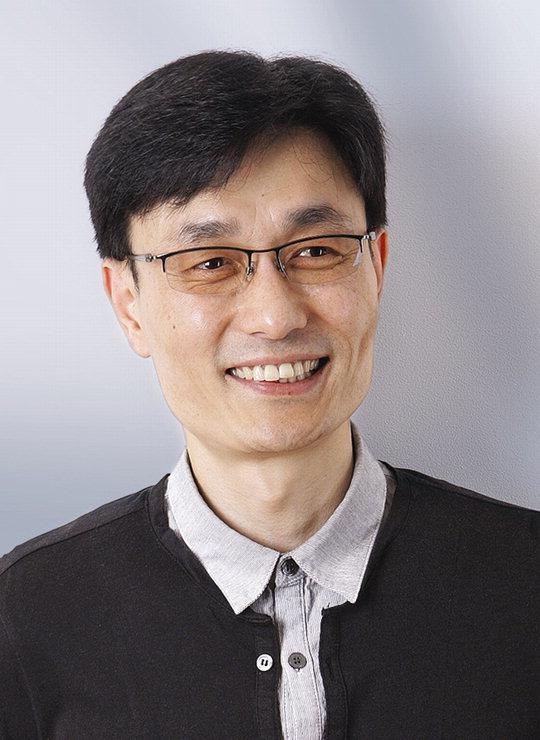
황금해안, 그 이름이 함축하듯 이 지역은 예로부터 금을 다량으로 보유한 집산지였다. 1471년 바다를 누비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던 포르투갈의 황실 탐사대는 앙코브라 계곡과 볼타 강 사이에 있는 황금의 땅을 발견했다. 이를 시작으로 가나의 해변에는 300년 동안 자그마치 70여 개의 요새와 성이 세워졌다.
네덜란드와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등 각국이 해변 곳곳에 세운 이들 요새는 `골드러시`(Gold Rush)의 상징이었고 노예경제가 번창하던 시절에는 노예무역의 거점이었다. 팔려가는 흑인 노예들은 화장실이나 세면장도 없는 데서 몇 달씩 갇혀 지냈다. 견디다 못해 반항하는 이들은 따로 가둬놓고 물과 음식조차 주지 않았으며, 혹독한 매질로 주검이 되기 일쑤였다. 특히 반란 주모자들은 엎어놓고 사지를 묶은 다음 엉덩이 가죽 껍질을 벗기고, 피범벅 위에 화약 레몬즙 소금물 고춧가루 치료제를 섞어 문지르는 자행도 서슴지 않았다. 회저병도 막고, 노예라는 걸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려는 술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또한 황금해안에 거주하던 백인들의 삶도 지루하기 짝이 없어 실상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 백인들은 신변의 안전 때문에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 처지가 아니어서 대부분 성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말라리아와 황열병, 수면병으로 인해 죽는 이도 부지기수였다. 요새 안에는 백인 여성이 거의 없었다. 성에 굶주린 그들은 흑인 여성들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때문에 해안 지대 요새 주변에는 혼혈아들이 급증했다. 흑인 여성들은 백인의 아이를 배태하면 낯선 땅에 끌려가지 않을뿐더러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주인의 간택을 기다렸다.
흑인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존`이나 `벤다이크` 같은 유럽식 이름을 붙이고 요새 부근 마을에서 남다른 우월감을 지니고 살았다. 나아가 어처구니가 없지만 요새 안, 흑인들을 짐승처럼 가둬놓고 노예로 수출하던 본거지 한복판에는 가톨릭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노예무역이 성해지자 아예 상설 `노예시장`으로 용도가 뒤바뀐다. 한동안 학교로 쓰이다가 지금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증언하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I have a dream! You have a truth!"라는 기대지평을 백인의 명분으로 내세운 채 노예 수출의 본거지와 성당, 이 두 배반의 짝을 동시에 수렴했으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인간의 역사란, 저마다 독실한 양 내세우는 신앙이란 얼마나 불손한 진실인가. 회칠한 삶과 신앙이 어찌 이뿐이랴. 몇 세기에 걸쳐 노예무역이 번창하는 동안 유럽에서 이를 문제 삼은 기독교인은 드물었다. 오히려 그들 대다수는 노예 소유를 당연한 특권처럼 여기며 지냈다. 이야말로 종교인의 삶이 얼마나 타성적이고 허울에 찬 것이었는가를 일깨우는 산증거일 것이다. 오천만의 흑인이 이곳을 통해 미대륙으로 강제로 건너가 미흑인의 조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강자들의 강간으로 이룩되었으므로 마지막 슬픈 피의 기록을 남기는 건 바로 오늘을 사는 약자의 몫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희안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