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간이 만든 자연 김경은 지음·책보세·424쪽·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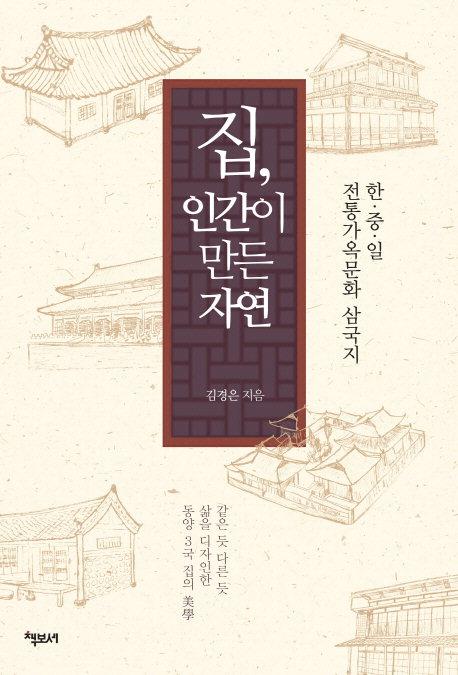
하지만 담을 기준으로 보면 동양이 더 개인주의적으로 보인다. 서양 가옥에는 담이 없다. 대저택이 아니라면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하는 펜스를 치는 것이 고작이다. 동양의 가옥은 담을 가진다. 어느 학자는 이를 '개인적 집단주의'로 규정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국가 등 소속된 집단을 위해서는 희생정신, 공생의식을 발휘하면서도 소속 밖의 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이다.
공간은 개인의 의식을 결정짓는다. '집, 인간이 만든 자연'의 저자는 3국의 전통가옥문화와 그 안에 깃든 사회구조 생활상, 의식을 소개한다. 동양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를 18세기 중엽으로 보고 당시 세 나라의 수도에 편재된 가옥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삶과 의식이 집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현대 한·중·일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대륙과 반도,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정치, 문화적 특성의 차이는 한중일 가옥에도 큰 차이를 낳았다. 한옥은 자연과 하나되는 공간이다. 자연과의 조화, 자유분방함, 과감한 생략과 균제성 등 한옥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랭이 공법'이다. 직경 20-30㎝쯤 되는 주춧돌을 주워 그 위에 나무기둥을 세운다. 나무 기둥도 휘면 휜 대로, 옹이가 있으면 옹이가 있는 대로 그냥 쓴다. 이때 기둥을 주춧돌 표면의 굴곡에 맞춰 깎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한국의 미는 곡선의 미를 잘 살린 지붕과 처마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같은 자연스러움은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한 삶, 수용할 줄 아는 삶과 맞닿아 있다.
일본의 전통가옥 현관으로 들어가면 좁고 긴 복도가 있고 복도를 따라 옆으로 방이 있다. 잦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한옥보다 훨씬 많은 기둥을 세우다 보니 집안구조가 복잡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저자는 일본의 보편적, 전통적 가옥구조인 공동주택(나가야)과 일본 특유의 배려문화를 연결지어 설명한다. 나가야는 노동자들의 주택이었다. 목조건물이었던 탓에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 같은 주거형태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습성이 배었다는 것이다.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지형을 가진 중국대륙에는 통일된 주거양식이 없다. 그러나 '높은 담', '작고 중첩된 문', '외벽을 향한 창문이 없는 내향적 건축구조'는 중국 전통가옥의 공통분모다. 전쟁과 재난이 많았던 탓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외부를 경계하는 듯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허베이지방의 전통가옥이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유일한 주거양식인 쓰허위안(四合院)역시 사방의 견고한 벽을 특징으로 한다. 황궁과도 건축원리가 일치하는 쓰허위안은 조상을 정점으로 유교적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해 지어졌다. 하지만 세대별, 가구별로 방을 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그러나 저자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만큼 좋은 일만 겪지는 않았을 것이고 불화를 피하기 위한 상책으로 중국 특유의 '무관심 문화'가 자리 잡았을 것이라 추측한다.
'집, 인간이 만든 자연'은 그동안 한·중·일의 문화비교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가 '한·중·일 밥상문화'에 이어 한·중·일 3국 문화비교 시리즈 두 번째로 출간한 책이다. 최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