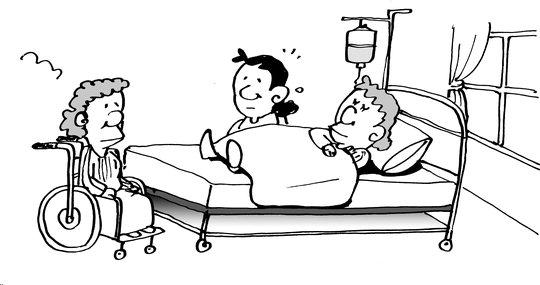박지찬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시냐?"고 물으면 "힘들지만, 좋은 생각을 유지하려고 힘쓴다"고 하셨다. 본인의 내면에서 절로 올라오는 불안함,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무척 위대해 보였다. 이 분은 이런 모습을 가까이 있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면서 선종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부정(죽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분노(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협상(절대자 또는 의사에게 매달린다), 우울(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수용(받아들인다)의 5가지 단계를 오르내린다. 수용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우울, 또 시간이 지나면 협상, 또 분노가 생기고, 또 시간이 흐르면 수용. 이렇듯 환자는 병을 받아들이고 예후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표현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이렇게 무척이나 힘든가 보다.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의료진 역시 힘들다. 나 역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과업이 주어진 것 같아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통증은 적극적으로 조절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은 거리를 두고 개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는 결국 나 스스로가 상처받을 까봐 환자들의 고통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호스피스 팀 모임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환자들을 힘들게 대하는 나 자신이 항상 느껴지는데, 저들은 왜 힘들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일까?', '내가 주는 도움보다 저들이 환자와 가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나와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들은 환자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점이 나와는 달랐고, 나같이 뭔가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환자와 가족을 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지막 여정을 같이 할 동반자라는 거다.
가장 힘든 사람은 가족도 의료진도 아닌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이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리라는 것을 알지만 수시로 앞날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에게 의료진이나 가족은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렵지만 고귀한 일일 것이다.
죽음이란 철저하게 혼자 떠난다. 사람이 죽으면 몸무게가 생전보다 21g이 가벼워진다고 한다. 그걸 빠져나간 '영혼'의 무게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려고 버틴다. 그러면서 갖고 가지 못하는 것들에 집착한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잘 받아들여도 폭력(暴力)이다. 되레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사람이 편안하게 간다. 자식을 앞세운 사람도 그렇다. '내 인생을 괜히 헛된 데 다 보냈구나' '일에 미쳐서 정작 소중한 가정을 소홀히 했구나' 후회하지 않는다. 죽음을 배우면 사는 것(生) 또한 달라진다.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