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살아남아 버렸다 이명석 지음·궁리·372쪽·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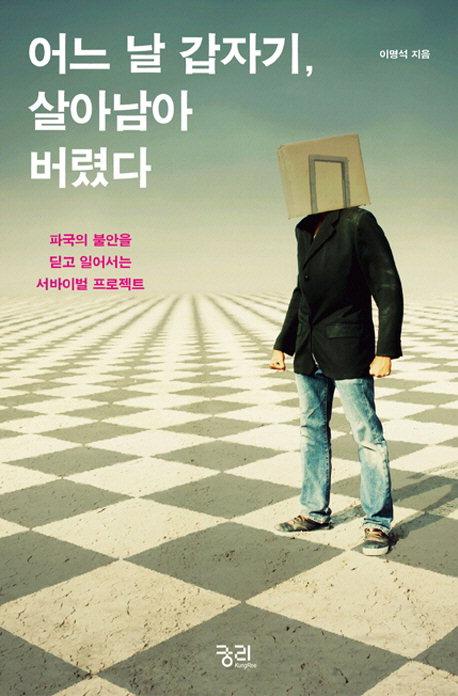
생각해 보면 참 많다. 어느 날 갑자기 불가항력적 힘에 의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생계가 아닌 생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들이.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일까? 비행기에 뚫리고 무너지는 월드트레이드센터, 멜트다운(meltdown)된 일본의 원전, 사스, 조류독감에 죽어가던 사람들, 살아 숨쉬며 차가운 땅에 파묻히던 소, 돼지, 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하루 아침에 피자가게 배달부가 된 월가의 금융맨. 영화같은 재난과 파국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침투한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미래의 재난을 상상하며 굳이 불안에 떨 필요가 있나?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남아 버렸다'의 저자는 생각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써보고 그 이후, 생존의 상황을 상상한다면 살면서 겪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만화, 소설, 영화 속엔 수많은 종류의 재난이 등장하고 그 재앙의 상황에 적응하며 생존해가는 주인공들이 있다. 저자는 이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찾았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살아남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최후의 성, 말빌'. 중간권의 차가운 대기가 대기권에 들어오며 극심한 한파를 겪게 되는 상황을 담은 '아틱 블래스트', 명작 좀비영화라 불리는 '28일 후', 한강의 밤섬에 표류하는 남자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소녀 이야기를 다룬 '김씨 표류기', 남녀를 한 집에 몰아넣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방송에 담아내는 쇼 '빅 브라더' 등 수많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재난 상황의 생존분투기를 재난전문가나 미래학자가 아닌 문화비평가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들은 삶의 근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어떤 원인에서든 파국 이후의 상황은 문명의 붕괴와 단절, 고립이다. 지진의 조짐이 보인다면 뭐부터 챙기겠는가. 핸드폰? 지갑? 이것들은 모두 문명사회가 탄탄히 유지될 때나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명 세계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문명이 무너지면서 그저 가방의 부피와 무게를 차지하는 쓰레기로 전락했다. 이러한 가치의 추락은 물건만이 겪는 운명은 아니다. 학력, 지위, 가문 등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것들이 한 모금의 물보다도 의미없는 것이 되었다."
선행 학습, 조기 유학, 스펙 쌓기… 이른바 일류를 향해 냅다 뛰어나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이 생존하는데 전혀 필요치 않은 것들로 변할 순간들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 지진으로 대참사가 났을 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경제적 파국으로 살던 집을 잃었을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 방법, 생존하는데 유리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협력적·도덕적 태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문학적 사고 같은 것 아닐까.
책의 말머리에 극단적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주진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책 곳곳에 팁으로 전하는 생존의 기술은 아무래도 재밌다. 서바이벌이라는 주제 자체도 솔깃하게 만들지만 다양한 대중문화 텍스트들의 상상력, 문화비평가로 활동해 온 저자의 손끝에 풀어지는 색다른 시각이 더해져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최정 기자 journalcj@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