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 크리스천 퍼렌티 지음·강혜정 옮김 미지북스·480쪽·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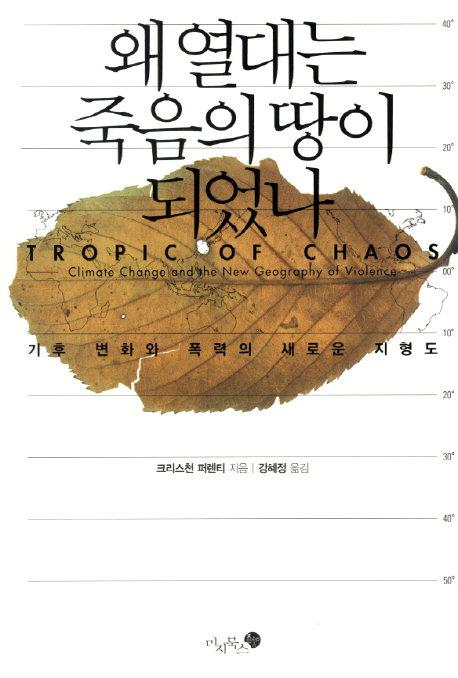
탐사보도 전문가이자 뉴욕시립대 객원교수인 크리스천 퍼렌티는 기상이변 때문에 생존의 토대에 직격탄을 맞은 열대지역 국가들의 모습을 전한다. 무장한 비적(匪賊)이 위협하고 총격전이 난무하는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취재하고 풀어낸 이야기들이다.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해빙, 대형 허리케인 같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인류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고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과학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퍼렌티는 이 재앙에 대처하는 법에 '완화'와 '적응' 기제가 있다고 언급한다. 완화는 말 그대로 이 재앙을 초래한 원인, 즉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퍼렌티가 주목한 쪽은 적응, 특히 군사적 적응의 실태다. 이 폭력적 방식의 기후변화 적응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곳이 열대지역으로 그는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와 같은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과 멕시코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겪는 '가뭄'과 '홍수'라는 기표에는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내전으로 총알받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이 담겨있다.
열대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이 강수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농업에 종사한다. 하지만 일정하던 강수 주기는 왜곡됐고 그마저도 극심한 가뭄과 홍수의 연속이기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변화에 아프리카 유목민들은 물을 차지하고 가축을 약탈하기 위해 타 부족과 죽고 죽이는 상황에 놓인다. 힌두-이슬람교 갈등의 분쟁지역으로만 알려진 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이면에도 '물의 소유'라는 생존문제가 걸려있다. 가뭄을 이겨내는 작물인 양귀비를 키우는 아프가니스탄 농민들이나 마약에 찌든 멕시코 사회의 구성원의 모습은 빈곤한 국가의 타락이라기 보단 차라리 처절한 생존에 가까운 것 같다.
저자는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파탄 나게 된 이유를 정치, 역사적 맥락을 쫓으며 설명한다. 그들 역사의 기저에는 냉전시대 군사주의 잔재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무너진 경제적 토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올해 한국도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다. 가난, 전쟁, 갈등, 비도덕으로 점철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열대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 혹은 동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암울한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최정 기자 journalcj@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